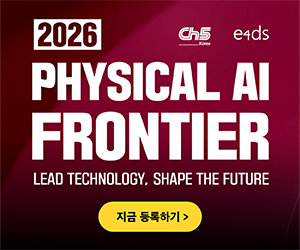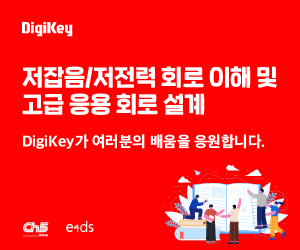“폐배터리 재자원화 전략으로 자원 안보·산업 경쟁력 두 마리 토끼 잡아야”
기사입력 2025.07.24 06:00
2030년 배출량 급증, 폭발적 성장 미래 자원 시장
단순 환경정책 넘어 전략 자원 국내화 기회 될 것
단순 환경정책 넘어 전략 자원 국내화 기회 될 것
“폐배터리는 더 이상 폐기물이 아니다. 재자원화 전략으로 자원 안보와 산업 경쟁력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할 시점이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최근 발표한 ‘신산업 제안 시리즈⑦-폐배터리’ 보고서를 통해 폐배터리를 ‘도시광산 자원’으로 활용하는 한국형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30년부터 본격적으로 배출될 국내 전기차 폐배터리는 10만개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배터리 재자원화를 통한 자원 내재화와 산업경쟁력 강화가 국가 전략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는 평균 8∼15년의 수명을 가진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 상용화된 전기차들이 2030년경부터 폐배터리 배출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협은 2030년까지 국내에서 10만개 이상의 폐배터리가 배출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폐배터리 배출량은 2023년 17만대에서 2040년에는 4,227만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에 따른 재활용 시장 규모는 2023년 108억달러에서 2040년 2,089억달러로 연평균 17%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jpg)
▲주요국, 재자원화 정책에 대규모 예산 투입
한국은 주요국 대비 재정 및 제도적 지원이 미흡한 상황이다.
2024년 한국환경공단이 추진한 회수체계 구축 사업의 총 예산은 15억원에 불과하며, 민간의 조기 시장 진입을 지원하기에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한경협은 △재사용·재활용 배터리 공공구매 확대 △전용 HS코드 신설 △사용후 배터리 관련 제도 정비 등 3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공공구매 지원 확대는 기업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해 재활용 배터리 제품에 대한 인증과 공공기관 의무 구매 비율 상향이 필요하다.
HS코드 신설을 통한 통관 체계 정비와 관련해서는 현재 폐배터리와 재활용 소재(BM)는 일반 전자폐기물 코드로 통합돼 수출입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전용 코드 신설과 수입 절차 간소화를 통해 국제기준 선도가 가능하다.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법안 추진과 관련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을 통해 통합 정보관리 체계와 공공 거래시스템 등이 도입될 예정이다. 다만 ESS용 BM의 폐기물 분류 문제 등 기준 일관성 확보가 시급하다.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리튬, 코발트, 니켈, 흑연은 대부분 해외 생산과 정제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미·중 패권 경쟁,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수급 불확실성을 심화시키는 요소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폐배터리 재자원화는 단순한 환경정책을 넘어 배터리 순환 생태계 구축, 자원안보 확보, 신성장 동력 발굴을 모두 달성할 수 있는 전략적 수단”이라며 “정부가 보다 과감한 재정·제도적 대응을 통해 국내 배터리 산업의 경쟁우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웨비나
많이 본 뉴스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장은성 070-4699-5321 , news@e4d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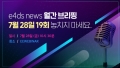


.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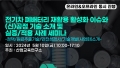

.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