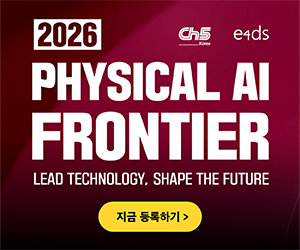[배종인의 혁신포커스] “韓 피지컬 AI 대규모 투자 통한 핵심 기술 자립 必”
기사입력 2025.07.21 14:56

▲이해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AI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원이 발표하고 있다.
연평균 39% 성장 2030년 약 168조 규모 전망
국가 차원 전략 지속·국산화·인력 양성 나서야
국가 차원 전략 지속·국산화·인력 양성 나서야
“세계 각국이 제조업 등에서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며, AI 응용을 통해 휴머노이드, 로켓, 고속철도, 군사용 로봇, 드론 등에서 피지컬 AI에 대한 성과를 내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속적인 대규모 투자를 통해 제조나 물류 이외에도 스마트시티, 의료, 국가안보 등 다양한 산업 기반 중심의 전략적 확산을 통해 피지컬 AI의 핵심 기술 자립이 필요하다”
이해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AI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원은 지난 16일 한국컨퍼런스센터 대강당에서 임베디드소프트웨어·시스템산업협회(회장 이창열, 이하 KESSIA) 주최로 개최된 ‘2025 임베디드 AI 트렌드 포럼’에서 ‘Physical AI 개발 동향 및 관련 정책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하며, 피지컬 AI는 산업 경쟁력과 국가 안전을 좌우하는 차세대 기술로 선제적 대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해수 선임연구원은 “국내외 산업·학계가 주목하는 피지컬 AI는 인식·추론·계획·행동을 연속적으로 수행하며 물리적 세계에서 자율작동하는 지능형 시스템을 의미한다”며 “텍스트와 이미지를 다루던 생성형 AI를 넘어 실제 로봇 팔, 자율주행차, 드론 등 하드웨어에 스며드는 ‘물리 인공지능’ 단계에 접어들면서 제조·물류·헬스케어·스마트시티 등 활용 영역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AI 에이전트가 소프트웨어 환경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던 단계에서, NVIDIA의 젠슨 황 CEO는 ‘다음 프론티어는 피지컬 AI’라 선언하며 GPU 칩 로드맵을 지속적으로 공개했다”며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그랜드뷰리서치에 따르면, 피지컬 AI 시장은 2023년 127억달러에서 2030년까지 연평균 38.5% 성장해 약 168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피지컬 AI의 핵심기술로는 멀티모달 학습(시각·음성·3D 공간 데이터)과 로봇 특화 모델(VLA)로 복합 환경에서도 자율 결정을 위한 AI 알고리즘과 라이다·레이다·이벤트 기반 센서 퓨전으로 물리 환경 인식 정밀도를 강화하는 센서·컴퓨터 비전, 클라우드 의존도를 낮추고, 현장 실시간 연산을 가능케 하는 엣지 서버 및 MPU(모바일 프로세싱 유닛)의 네트워크·엣지 컴퓨팅을 들었다.
특히 피지컬 AI의 ‘근육’이라 불리는 액추에이터는 모터·감속기·엔코더 등으로 동작을 생성한다. 최근에는 AI 제어가 통합된 스마트 액추에이터가 등장해 실시간 환경 적응성과 설계 복잡도를 동시에 낮추며, 메타·워익 로보틱스의 알레그로 핸드처럼 고도화된 그리핑을 가능케 한다.
주요 적용사례를 살펴보면 휴머노이드에서는 테슬라 ‘옵티머스’와 피겨AI 로봇은 제조·서비스 현장 시범 투입 단계를 보이고 있고, 자율주행에서는 테슬라·구글 웨이모·BYD 등이 FSD·라이다·AI 모델 융합으로 도심 로봇택시 개발을 가속화 하고 있다.
드론(UAV)에서는 군사·농업·공공안전에서 자율비행·야간촬영·정밀 방제에 활용하며, AMR·AGV에서는 비정형 창고·병원·호텔에서 SLAM 기반 자율이동 물류 솔루션이 주목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기술·사회적 한계 및 과제도 존재하는데 시뮬레이션과 현실 간 갭으로 불확실성 높은 실제 환경에 대한 적응력 강화가 필요하고, 에너지 효율·배터리와 관련해서는 고밀도 리튬셀 및 저전력 반도체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과도한 비용 해결 및 책임소재 불명확, 프라이버시·인간 존엄성·안전 규제의 윤리·법적 쟁점도 해결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세계 각국은 피지컬 AI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은 2009년 시작된 ‘로보틱스 로드맵’ 개정·R&D 과제를 발표하고, 300여개 프로젝트를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
중국은 ‘중국제조 2025’ 및 양회서 ‘피지컬 AI’를 공식 명기하고, 부품·부품망부터 통제하고 있다.
EU·일본은 AI 규제 및 윤리 원칙을 병행하고 있으며, 일본은 산업용 로봇에 강점을 가지고 회복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30년 K로봇 산업규모를 현재 5조6,000억원에서 20조원까지 4배 이상 키운다는 목표로 △기술, 인력, 기업 등 로봇 3대 핵심경쟁력 강화 △K로봇의 전면 확산 △로봇 친화적 환경 조성이라는 3가지 전략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 또한 K 휴머노이드 연합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피지컬 AI에 들어갈 수 있는 다양한 주요 구성 요소들이 자립화가 안 돼 있어 이런 부분들이 국산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됐다.
이해수 선임연구원은 “피지컬 AI의 정책 시사점으로 국가 차원의 피지컬 AI 전략 지속, 핵심 산업기반 중심의 전략적 확산, ‘Phisical AI 전략위원회’ 신설, 핵심 부품·소프트웨어 국산화 투자, 테스트베드·얼라이언스 구축 지원, 인력 양성 강화 및 국제 협력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관련 웨비나
많이 본 뉴스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장은성 070-4699-5321 , news@e4ds.com
.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