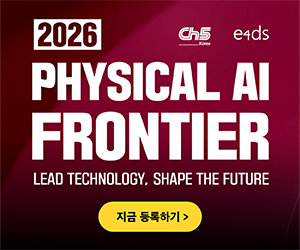[배종인의 혁신포커스] “피지컬 AI, 인간-로봇 협동 혁신적 변화시킨다”
기사입력 2025.11.12 12:06

▲고려대 서승호 교수가 ‘실행하는 AI, 협업하는 로봇-Physical AI의 현재와 산업적용’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실제 적용 위해서 안전성·비용·데이터 표준화·프라이버시 등 과제 해결해야
산업 현장 로봇 안전성·유연성 중요, 자연어 통한 직관적 제어 능력 필수적
산업 현장 로봇 안전성·유연성 중요, 자연어 통한 직관적 제어 능력 필수적
“피지컬 AI(Physical AI)가 인간과 로봇의 협동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세이프틱스(Safetics) 주최로 11일 포스코타워 역삼 3층 이벤트홀에서 개최된 ‘협동로봇 5대 브랜드와 함께하는 Next-Gen Human-Robot Collaboration - Physical AI, 로봇 한계를 넘어서는 Game-Changer’ 세미나에서 고려대학교 인공지능학과 서승호 교수는 ‘실행하는 AI, 협업하는 로봇-Physical AI의 현재와 산업적용’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서승호 교수는 독일 인공지능 연구소와 삼성전기 등 산업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생성형 AI와 멀티모달 러닝을 활용한 인간-로봇 협동 연구의 최신 동향과 실제 적용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AI와 로봇 기술이 실생활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데이터 수집과 해석, 실제 로봇의 움직임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사이클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스마트폰이 우리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을 만큼 디지털 월드가 실생활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AI가 실생활에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스마트 글래스와 로봇이 실생활 변화를 이끄는 핵심 디바이스가 될 것”이라며, 인간 중심의 로봇 설계와 제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AI 분야에서 주목받는 트렌드로 ‘피지컬 AI’와 ‘VLA(비전-랭귀지-액션)’ 모델이 꼽힌다.
서 교수는 “기존의 인식 중심 AI에서 이제는 실제 물리적 행동까지 연결하는 피지컬 AI로 패러다임이 이동하고 있다”며, 구글 딥마인드의 RT-2, 세이캔(SayCan), 오픈VLA 등 주요 사례를 소개했다.
이러한 모델들은 대규모 멀티모달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연어 명령을 이해하고 실제 로봇의 행동으로 연결하는 기술이다.
서 교수는 “온디바이스(On-device) VLA와 클라우드 기반 VLA가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현장 환경에 따라 적합한 방식이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산업 현장에서는 로봇의 안전성과 유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자연어를 통한 직관적 제어와 다양한 물건을 인식·처리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한국 사회에서, 물류·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서 교수가 참여하는 연구팀은 물류센터에 투입될 파운데이션 모델 기반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과제를 진행 중이다.
이 로봇은 다양한 박스와 물건을 인식하고, 자연어 명령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목표다.
또한 포스코와 협력해 고온·고위험 환경에서 작업자의 안전을 보조하는 사족보행 로봇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다.
서 교수는 “작업자의 행동을 정확히 인식하기 위해 웨어러블 센서와 AI를 결합한 연구가 활발하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IMU 센서와 근전도(EMG) 센서를 활용해 손가락 제스처까지 정밀하게 인식하고, 이를 통해 로봇을 원격 제어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다.
또한 디지털 트윈 환경에서 로봇을 안전하게 제어하는 실험도 소개했다.
데이터 수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생성형 AI를 활용한 가상 데이터 생성, 텍스트-모션 변환 등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서 교수는 “실제 환경과 가상 데이터의 차이를 줄이고, 물리적 제약을 반영한 자연스러운 모션 생성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말했다.
서 교수는 “AI와 로봇 기술이 산업 현장에 실제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안전성, 비용, 데이터 표준화, 프라이버시 등 다양한 기술적·사회적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AI의 설명 가능성과 사람 중심의 설계, 온디바이스 AI의 경량화, 파운데이션 모델의 산업 맞춤형 파인튜닝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AI와 로보틱스가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인간 중심의 AI·로봇 연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웨비나
많이 본 뉴스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장은성 070-4699-5321 , news@e4ds.com






.jpg)
.jpg)
.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