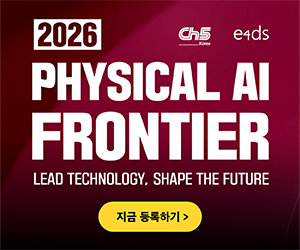[2025 e4ds Tech Day]“2034년까지 SiC 수십배 성장, 공급망 안정화·국내 양산 인프라 등 대응 必”
기사입력 2025.09.26 15:50
.jpg)
▲한국전기연구원(KERI) 김형우 센터장이 ‘2025 e4ds Tech Day’ 행사에서 발표하고 있다.
SiC 1,200V 이상 고전압 영역 유리, 제조 난이도·높은 원가 장벽
국내 높은 기술 반면 원가 경쟁력·패키징·중국 저가 공세 대응 必
국내 높은 기술 반면 원가 경쟁력·패키징·중국 저가 공세 대응 必
“2034년까지 SiC(실리콘 카바이드) 전력반도체 시장은 수십 배 성장 할 것이다. 국내 연구 역량은 상당한 수준이지만 중국 등 경쟁국의 가격공세와 패키징, 양산성 문제를 기술·정책적으로 동시에 대응해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한국전기연구원(KERI) 차세대반도체연구센터 김형우 센터장은 지난 9월9일 개최된 ‘2025 e4ds Tech Day’ 행사에서 ‘SiC 기반 전력반도체의 국내외 기술 및 시장 동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형우 센터장에 따르면 실리콘 카바이드(SiC)는 와이드 밴드갭과 우수한 열전도성으로 고전압·고온·고신뢰성 전력전자 분야의 핵심 소재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1,200V 이상 전력모듈과 전기차 파워트레인·급속충전 인프라에서 효율 향상과 소형화, 냉각부하 감소라는 실질적 이점을 제공한다.
기술 측면에서는 4H‑SiC 기반의 웨이퍼·에피 성장과 유니폴라 소자(쇼트키 다이오드·JBS/MPS·MOSFET) 상용화가 진전됐다.
MOSFET은 플래너형과 트렌치형이 공존하며, 트렌치형은 저전압(≤1,200V)에서 효율 우위를 보이나 고전압(≥1,700V)에서는 에피 두께·확산 저항 한계로 플래너 구조가 여전히 경쟁력을 가진다.
반면 바이폴라 소자(IGBT, BJT 등)는 P형 도펀트의 높은 활성화 에너지(약 200meV)로 인해 P타입 농도 확보가 어려워 상용화가 지연되고 있다.
집적회로(SiC CMOS·게이트 드라이버) 연구도 활발해 고온(200∼500℃) 동작용 IC와 패키징, 인터커넥션 기술 개발이 병행되고 있다.
산업·공급망 측면의 핵심 제약은 웨이퍼 공급과 원가다.
SiC는 고온 승화 성장 공정(>1,800∼2000℃)과 결함 관리가 까다로워 고품질 웨이퍼 공급처가 제한적이며, 6∼8인치 웨이퍼 가격은 실리콘 대비 수십 배 수준으로 시장 진입 장벽이 크다.
글로벌 웨이퍼 시장은 소수 선도업체가 주도하고 있고 중국계 기업의 저가 공세가 심화되며 밸류체인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다.
시장은 전기차(xEV)와 충전인프라가 견인하고 있으며, xEV 파워트레인·DC 고속충전·태양광 인버터·산업용 모터·철도·전력 인프라 등이 주요 수요처다.
단기적으로 2023∼2024년 전기차 수요 변동과 일부 안전 이슈로 시장 성장이 주춤했으나, 장기 성장 전망은 여전히 견조하다는 분석이다.
옴디아, 욜 등 시장자료를 인용한 전망에 따르면 2034년까지 SiC 전력반도체 시장은 수십배 성장할 수 있다는 예측이 제시된다.
정책·산학협력 과제로는 웨이퍼 공급망 안정화·원가 절감(대량생산·공정 고도화)·고온 패키징·인터커넥션(텅스텐 등 대체소재 포함) 개발·국내 양산 인프라 확충이 꼽힌다.
김형우 센터장은 “국내 연구역량(소자·공정·분석)은 상당 수준이지만 중국 등 경쟁국의 가격공세와 패키징·양산성 문제를 기술·정책적으로 동시에 대응해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 웨비나
많이 본 뉴스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장은성 070-4699-5321 , news@e4ds.com


.JPG)
.JPG)





.jpg)